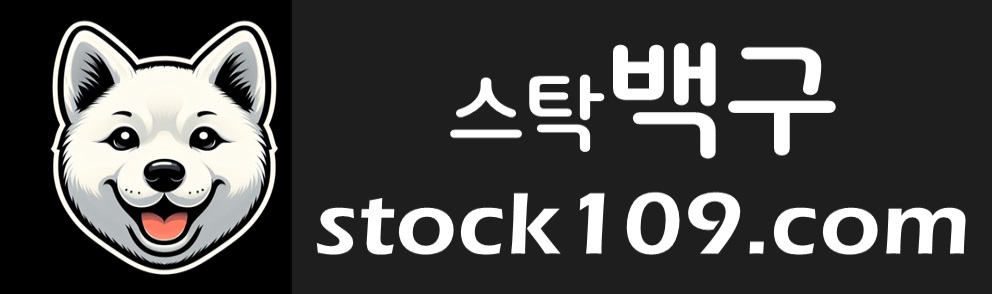동원수산, 코스피, 030720 / 참고: 동원그룹(동원참치)과 관계없음.
1970년 5월 설립(부산 ‘신흥냉동’이 모태, 1970년 동원수산으로 사명 변경), 본사는 서울 마포구. 원양 참치어업·수산물 가공/유통·냉동창고 등을 영위하며, 16척의 원양어선과 중국·뉴질랜드 법인을 보유한 중견 원양수산업체입니다. 현재 연결 종속회사는 5개(주요 2개), 비상장 계열사는 7개이며, 동원그룹(동원참치)과는 이름만 비슷할 뿐 지배·계열 관계는 없습니다.
1. 테마(수산, 구제역/광우병 수혜 등)와의 연관성
1) 수산·원양어업 테마
동원수산은 태평양·인도양 참치연승선 14척, 뉴질랜드 트롤선 2척을 통해 횟감용 참치를 어획하고, 중국 위해동원식품·뉴질랜드 DW New Zealand 등을 통해 일본·미국·유럽 등에 수출하는 원양어업/수산가공 기업입니다.
→ 수산/수산식품, 원양어업, 참치 관련 테마의 전형적인 구성 종목입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 통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러시아 항공로 폐쇄에 따른 수산물 가격 급등
등의 이슈가 나올 때마다 “수산주”·“해산물 관련주”의 대표주로 묶여 단기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2) 구제역/광우병·AI(조류인플루엔자) 수혜 테마
증권사·테마 리포트에서 참치 원양어업주는 육계·양돈 질병(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발생 시 대체 단백질 공급원으로 부각되며 “수혜주”로 묶여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AI·구제역 이슈 때 육류 소비 회피 → 수산물 수요 증가 기대가 형성되면서 동원수산·사조씨푸드·한성기업 등 수산 관련주들이 ‘반사이익 테마’로 동반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기타 테마 연관성
후쿠시마 오염수·일본 수산물 규제 테마
2023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확정 및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 소식 때, 동원수산은 “국내·제3국산 수산물 공급처”로 주목받으며 오염수/방사능 수산 테마에 포함되어 급등했습니다.
과거 정치 테마주 리스트에 언급된 적은 있으나
2012년 총선·대선 국면에서 각종 ‘억지 정치 테마주’ 리스트에 이름이 거론된 적은 있으나, 특정 정치인과의 뚜렷한 인연이나 지배구조 상의 연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정치 테마는 거의 없고, 수산/원양어업·오염수/수입규제 성격이 주 테마입니다.
정리하면, 핵심 테마는 수산·원양어업 + 육류 질병/오염수 이슈의 대체 수혜주 정도로 보면 됩니다.
2. 회사 일반 현황·사업 개요
1) 기본 정보
설립일: 1970.05.05
상장일: 1996.11.22 (코스피)
본사: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8길 38, 동하빌딩 4층
주요 사업:
원양 참치연승·뉴질랜드 트롤 어업(횟감용·캔용 참치 등)
수산물 가공·냉동·냉장창고 운영
수산물·식품 유통 및 곡물가공(빵가루 등)
보유 선박: 총 16척(참치연승선 14척, 뉴질랜드 트롤선 2척 기준)
연결 종속회사: 5개 (주요 종속사 2개)
계열회사(상세, 모두 비상장) 예시
위해동원식품(유) (중국, 수산가공·유통)
SANWON LTD. (뉴질랜드, 트롤어업)
DW NEW ZEALAND LTD. (뉴질랜드)
(주)윤국식품 (국내 식품유통)
(주)유왕, (주)유왕식품, WEIHAI YK TRADING 등
→ 상장 계열사·관계사 없음. 동원수산 연결·관계기업 중 한국 증시 상장법인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사업 부문·매출 구조 (2024년)
사업보고서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별 매출’ 기준(연결, 제55기, 2024년)
단위: 백만원, %
| 구분 | 내용 | 매출액(백만원) | 비중(%) |
| 수산사업부문 | 트롤·참치연승(원양어획, 참치류 등) | 97,735 | 53.2 |
| 수산물유통부문 | 국내·해외 수산물 도소매, 가공품 유통 | 73,598 | 40.1 |
| 곡물제조업 외 | 빵가루·냉동냉장료, 임대수익 등 기타 | 12,318 | 6.7 |
| 합계 | | 183,650 | 100.0 |
→ 참치·원양어획(수산사업부문) + 수산물 유통이 전체 매출의 ~93%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수산·원양어업 기업입니다.
3. 최근 3년 연결 재무제표 요약 (K-IFRS, 연결 기준)
사업보고서 ‘요약연결재무정보’ 기준(단위: 백만원)
| 구분 | 2024년(55기) | 2023년(54기) | 2022년(53기) |
| 매출액 | 183,650 | 141,945 | 177,039 |
| 영업이익(손실) | 5,324 | -19,400 | 5,801 |
| 당기순이익(손실) | 5,208 | -17,677 | 6,066 |
| 자산총계 | 108,869 | 114,612 | 121,790 |
| 부채총계 | 60,081 | 71,959 | 59,216 |
| 자본총계 | 48,789 | 42,652 | 62,573 |
| 자본금 | 23,269 | 23,269 | 23,269 |
| 부채비율(%) | 123.1 | 168.7 | 94.6 |
특징
- 2022년: 정상적인 흑자 구조(영업이익 58억, 순이익 61억, 부채비율 94.6%)
- 2023년: 매출 감소 + 큰 폭의 영업손실(194억)로 순손실 177억, 자본이 급감 → 부채비율 168.7%로 급등
- 2024년: 매출 회복과 함께 영업이익·순이익 흑자 전환, 부채 축소·자본 회복으로 부채비율 123% 수준까지 개선
4. 대주주·지분 구조 (공시 기준)
1) 주요 주주 현황 (요약) /단위: 주, %
| 구분 | 주주명/집단 | 관계 | 지분율(%) | 비고 |
| 최대주주등 | 왕기철 외 9인 | 창업주 일가·특수관계인 | 20.11 | 935,952주 수준(추정) |
| – 개별 대주주 | 왕기철 | 창업주 장남, 부회장 | 7.01 | 326,047주 (최대 단일주주) |
| | WANG JR KI YONG (왕태현) | 왕기철 부회장의 조카, 대표이사 | 4%대 중반 | 해외·중국 사업 총괄 |
| | 왕인상 | 재무 전문가, 공동대표 | 4%대 초반 | |
| | 박경임 외 | 창업주의 재혼 배우자·일가 등 | 수% | 과거 경영권 분쟁 당사자 |
| 우리사주조합 | 동원수산우리사주조합 | 임직원 지분 | 4.93 | |
| 5% 이상 기타 주주 | – | – | – | 현재 보고된 5%+ 외부 주주 없음 |
| 유동주식 | 일반·기관 투자자 등 | | 74.96 | FnGuide 기준 free float |
실질 지배력은 창업주 왕윤국 명예회장의 직계(왕기철·왕태현 등) 및 가족·특수관계인 블록 약 20%로 추정됩니다. 지분율이 아주 높은 편은 아니어서 과거·현재 모두 지배구조 이슈(경영권 분쟁·행동주의 펀드 개입 등)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2) 대주주 약력·역할
① 왕기철 부회장 (최대주주, 창업주 장남)
창업주 고(故) 왕윤국 명예회장의 장남
2008년 3월부터 동원수산 대표이사로 선임, 약 15년간 회사 경영 총괄
2011~2013년: 계모(박경임 씨) 및 이복 동생 측과 경영권 분쟁 겪음
2011년 12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본인·특수관계인에게 배정해 지분 0.5% → 12.59%로 급증시키며 경영권 수성에 성공(이때 BW가 사실상 왕기철 측 지분 확장 수단)
이후 창업주 상속 과정에서 추가 지분을 승계, 최대주주 지위를 확고히 함
2023년 4월: 나이를 이유로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현재는 부회장·사내이사로 이사회 의장 역할
② WANG JR KI YONG (왕태현, 공동대표, 조카)
왕기철 부회장의 조카, 미국 국적
동원수산에서 중국 및 해외사업(특히 중국 위해·뉴질랜드 법인)을 총괄해 온 인물
2023년 4월부터 왕인상 부사장과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
4%대 중반의 지분을 보유한 2세 경영자 성격으로, 향후 경영 승계를 염두에 둔 구조로 보임
③ 왕인상 공동대표 (전문경영인)
1991년 동원수산 입사 후 30년 이상 재직
재무·관리라인 출신, CFO 성격의 전문경영인
현재 공동대표이사로서 재무·내부 통제, 자회사 관리 등을 총괄
5. 상장 이력·자본 변동·사명 변경 및 주요 이벤트
1) 상장·사명 관련
1954년: 부산에서 ‘신흥냉동’으로 창업 (왕윤국)
1970년: ‘동원수산주식회사’로 사명 변경 및 법인 정비
1996년 11월 22일: 코스피 상장(유가증권시장)
현재까지 사명 변경, 특례상장 이력 없음.
2) 자본 변동·CB/BW 관련 주요 이력
2009년 전후:
약 99억원 규모의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 일부가 주식으로 전환되며 소액주주·특정 세력 지분 확대에 이용된 정황이 있었던 시기.
2011년 12월:
120억원 규모 BW 발행, 신주인수권을 왕기철·왕수지 등 특수관계인에게 배정.
이후 1년 10개월 동안 신주인수권 행사로 45만주 이상 신규 취득 → 왕기철 지분 0.5% → 12.59%로 급증, 최대주주 지위 확보.
2016년 7월:
50억원 규모 전환사채(CB) 발행(사채만기 5년, 이자 2% 수준, 무보증).
2017~2018년 사이 일부가 보통주로 전환되며 자기자본 확충·부채 감소에 기여(자본금 약 8억원 증가). 나머지는 만기 상환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잔존 CB/BW는 없는 상태로 판단됩니다.
→ 이들 BW·CB는 경영권 방어(2011년)와 재무구조 개선(2016년)이라는 두 가지 역할을 했고, 현재는 잠재 희석 리스크는 크지 않은 구조입니다.
3) 대주주 변경·경영권 관련 특이사항
2011~2013년: ‘계모 vs 왕자’ 경영권 분쟁
창업주 왕윤국 명예회장의 재혼 배우자(박경임)와 장남 왕기철 사이의 경영권 분쟁.
박경임·딸(왕기미 등) 측이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교체를 시도, 이후 BW·지분매수 등을 통해 양측이 치열한 표 대결.
2013년 창업주 사망 후 상속 지분이 왕기철에게 많이 배분되면서 왕기철 측 승리로 마무리.
2023년: 행동주의 펀드 개입
2023년 상반기, 행동주의 성격의 투자사(보아스에셋 등)가 동원수산 지분 5~7%대를 매집, 주주 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
이후 주가 급등과 함께 해당 지분이 단기 차익 실현되며 5% 미만으로 감소(보고의무 해지). 현재는 5% 이상 외부 주주는 없는 상태.
→ 핵심 포인트:
지배주주 블록이 20% 안팎으로 낮아 외부 세력의 경영권 도전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존재.
과거 계모·자녀 간 분쟁, 최근 행동주의 펀드 개입까지 지배구조 리스크가 과거·현재 모두 있었던 회사입니다.
6. 최근 5년(2020~2024년) 주요 이슈·실적 변화 교차 분석
2020~2021년
뉴질랜드·중국 법인 실적 변동,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비·원자재비 변동성.
참치 가격·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이익이 크게 출렁였으나, 전반적으로는 흑자 기조 유지.
2022년
매출 1,770억원, 영업이익 58억원, 순이익 61억원, 부채비율 94.6%.
원양어획·수산물 유통이 비교적 호조였고, 재무구조도 안정적인 편.
2023년 – 대규모 적자 전환
매출 1,419억원(-20% 이상 감소), 영업손실 194억원, 순손실 177억원.
사업보고서 및 종속회사 실적 설명에 따르면:
DW NEW ZEALAND, SANWON, 유왕 등 해외·가공 자회사에서 큰 폭의 손실
어장 환경 악화(해수 온도 상승 등)로 인한 어획량 감소
연료비·인건비 등 운항 비용 상승
수산물 가격 변동성 및 재고 평가손실
이들 자회사 손실이 모회사 연결 이익을 크게 잠식.
이로 인해 이익잉여금이 크게 감소하고, 자본총계가 625억원 → 427억원으로 줄면서, 부채비율이 94.6% → 168.7%로 급등.
부채 측면에서는 운전자금·선박 관련 차입금이 크게 늘었고,
자본 측면에서는 대규모 순손실로 이익잉여금이 훼손되며 분모(자본)가 줄어든 것이 직접적 원인.
2024년 – 실적 회복·재무구조 일부 개선
매출 1,837억원(+29%), 영업이익 53억원, 순이익 52억원으로 흑자 전환.
사업보고서·실적 설명에 따르면:
참치 어획량 회복과 판가 안정,
수산물 유통부문 실적 개선,
해외 자회사 손실 축소, 일부 구조조정 등으로 수익성이 회복.
자본총계가 488억원으로 늘고, 부채도 601억원 수준으로 줄면서 부채비율이 123% 수준으로 하락.
다만, 2022년 수준(부채비율 95%)까지 복구되지는 못한 상태이며, 여전히 어업 경기 변동에 취약한 재무 구조입니다.
7. 2023년 적자 및 부채비율 100% 이상을 만든 원인 정리
1) 2023년 적자(순손실 177억원) 주요 원인
어획 환경 악화 + 비용 상승
해수 온도·어장 변화로 참치 어획량이 줄고, 연료비·인건비·수리비 등 선박 운항비가 상승.
해외·가공 자회사 손실 확대
뉴질랜드 트롤선·중국 가공법인에서 매출은 감소·비용은 증가하는 구조가 되었고,
일부 재고·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이 발생.
환율·수산물 가격 변동
달러·원 환율, 참치·수산물 국제 시세 변동으로 영업외 손익도 흔들림.
→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영업손실 194억원·순손실 177억원이라는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 부채비율 100% 상회(2023년 168.7%) 이유
분자(부채):
2022년 592억원 → 2023년 720억원으로 확대
어획 부진·재고 부담을 메우기 위한 운전자금 조달(차입금 증가) 영향
분모(자본):
2022년 626억원 → 2023년 427억원으로 급감
순손실 177억원이 이익잉여금 감소로 직격탄. 배당 여력도 거의 소멸.
결과적으로 “부채 증가 + 자본 축소”가 겹치면서 부채비율이 170% 가까이 급등한 구조입니다.
2024년에 흑자로 돌아서며 자본이 회복되고 일부 차입금을 줄였지만, 부채비율이 아직 120%대라 재무 완충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8. 전환사채·기타 부채 관련 자금 흐름
요약하면 과거에는 BW·CB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지만, 현재 잔존 전환증권은 거의 없고, 부채의 대부분은 은행 차입 등 금융부채입니다.
2011년 신주인수권부사채(BW, 120억원
발행대상: 왕기철·특수관계인 중심
자금 용도: 선박·시설 투자 및 운전자금(명목상), 실제로는 경영권 방어를 위한 지분 확대 수단 역할이 큼.
결과: 전환권 행사로 왕기철 지분이 약 0.5% → 12.59%로 급증, 최대주주 지위 확보.
2016년 전환사채(CB, 50억원)
무보증, 이자 2% 내외, 5년 만기.
2017~2018년 일부 전환 → 자본금 소폭 증가, 유입 자금은 선박 유지·보수, 운전자금 등에 사용.
만기 시잔존분은 현금 상환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공시 기준 잔존 CB는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재 부채 구조
운전자금·선박 관련 장단기 차입금이 대부분.
전환권이 붙은 증권은 거의 없어 대규모 희석 리스크는 낮지만,
재무 레버리지 자체(부채비율 120%대)는 업황 악화 시 자본 잠식 우려를 키울 수 있는 수준입니다.
9. 투자 시 추가로 고려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강한 업황·자연환경 민감도
원양어업 특성상 어장·기후·자원 관리 정책, 국제 쿼터 등에 실적이 크게 좌우됩니다.
2023년처럼 어획 부진·비용 상승이 겹치면 대규모 적자가 다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배구조 리스크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지분이 약 20%에 불과해, 외부 세력(행동주의 펀드 등)의 개입 여지가 구조적으로 존재합니다.
과거 계모–자녀 간 경영권 분쟁, 최근 행동주의 펀드 개입 사례에서 보듯,
경영 안정성,
중장기 전략 수행,
배당·자사주 등 주주친화 정책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해외 자회사 리스크
뉴질랜드·중국 법인(트롤어업, 가공·유통)이 실적 변동의 핵심입니다.
2023년에는 이들 자회사 손실이 연결 실적을 크게 훼손했고, 2024년에는 손실 축소·회복이 실적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 해외법인 손익 추이를 꾸준히 체크해야 합니다.
재무안정성
2024년 기준 부채비율 123%로 개선되었지만, 어업 불황이 1~2년만 지속돼도 다시 150~200%대로 치솟을 수 있는 레버리지 구조입니다.
추가적인 대규모 설비투자·선박 교체·M&A 등에 나설 경우, 유상증자·추가 차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테마/뉴스 민감주 특성
수산·오염수·구제역/광우병 등 “뉴스 이벤트”에 따라 일시적인 급등·급락이 잦은 종목입니다.
펀더멘털이 크게 변하지 않았음에도 가격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용 종목인지,
중장기 가치투자 대상인지
전략을 분명히 나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정리
- 동원수산은 50년 넘게 원양 참치 어업을 해 온 전통 수산 기업이지만,
- 업황·자연환경·환율·국제규제에 매우 민감하고,
- 지배주주 지분이 낮아 과거·현재 모두 지배구조 이슈가 반복된 회사입니다.
2023년 대규모 적자는 해외 자회사 손실·어획 부진·비용 상승의 복합 결과였고, 2024년에 어느 정도 회복했지만 재무적 쿠션이 넉넉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전제로,
- 원양어업 사이클,
- 해외 자회사 손익,
- 지배구조·행동주의 이슈 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