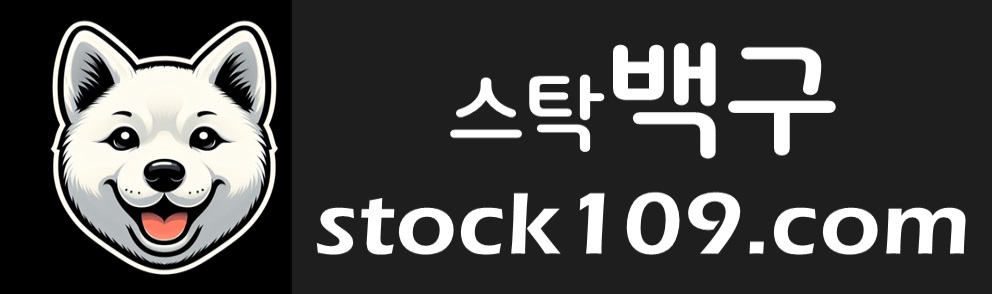- 마이페이지
- 게시판
- 기업 분석 및 이슈
- 큰바위군의 시장 분석
- 주식 초보가 알아야 할 것들
- 경제와 사회 그리고 통계
- 당일 테마 상한가 특이종목 정리
- 작은연못의 주식공부 이야기
- 테마와 종목 선정 이유
- 질문과 정보나눔 게시판
- 테마정보
- 테마별 종목
- 1.테마분류/ 가나다순
- 2차전지 (112)
- 2차전지 (LFP/리튬인산철) (11)
- 2차전지(나트륨이온) (10)
- 2차전지(생산) (3)
- 2차전지(소재/부품) (78)
- 2차전지(장비) (37)
- 2차전지(전고체) (20)
- 3D 낸드(NAND) (19)
- 3D 프린터 (12)
- 4대강 복원 (10)
- 4차산업 수혜주 (39)
- 5G 5세대 (51)
- AI-챗봇/ 챗 GPT (18)
- ARM관련주 (10)
- CCTV & DVR (12)
- DMZ 평화공원 (18)
-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25)
- HBM(고대역폭메모리) (24)
- LA산불화재 (29)
- LED (41)
- LED장비 (13)
- LNG 액화천연가스 (22)
- mRNA (18)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77)
- PCB (FPCB) (27)
- RFID(NFC) (19)
- SMR(소형원자로) (25)
- STO(증권형 토큰 발행) (21)
- UAM(도심항공모빌리티) (24)
- 가상현실 (29)
- 가상화폐 (비트코인) (25)
- 강관업체(Steel pipe) (11)
- 갤럭시부품주 (40)
- 건강기능식품 (36)
- 건설 중소형 (32)
- 건설기계 (18)
- 게임 (35)
- 겨울 (22)
- 고령화사회 (35)
- 고체산화물 연료전지(SOFC) (11)
- 골판지 (15)
- 골프 (15)
- 공기청정기 (10)
- 공작기계 (16)
- 광고 (23)
- 교육/온라인교육 (27)
- 구제역/광우병 수혜주 (20)
- 구충제 (9)
- 그래핀 (11)
- 그린벨트 해제 (14)
- 김포시 (11)
- 낙태/피임 (4)
- 남북경협 (27)
- 남북러 가스관사업 (14)
- 냉각시스템(액침냉각) (11)
- 네옴시티 (37)
- 네옴시티-사업협력 (11)
- 네이버AI (12)
- 네트워크통합 NI (8)
- 농업 (30)
- 뉴로모픽 반도체 (7)
- 니켈 (16)
- 당뇨 비만 (6)
- 대두 (7)
- 동해 석유 가스 (24)
- 돼지열병 ASF (32)
- 두나무(Dunamu) (12)
- 드론 (27)
- 딥페이크 (14)
- 럼피스킨병 (3)
- 렌터카 (5)
- 로보택시 (25)
- 로봇-감속기 (6)
- 로봇-산업용 협동로봇 (51)
- 로봇-삼성 (11)
- 리모델링/인테리어 (25)
- 리비안 RIVIAN) (24)
- 리츠 REITs (24)
- 리튬 (29)
- 마리화나(대마) (13)
- 마스크 (28)
- 마이데이터 (11)
-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4)
- 마이크로 LED (11)
- 마이크로바이옴 (19)
- 마켓컬리(Kurly) (15)
- 맥신 나노기술 (16)
- 맥신(MXene) (12)
-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21)
- 메타버스 (68)
- 면세점 (8)
- 면역항암치료 (31)
- 모듈러 주택-네옴시티 (17)
- 모바일 게임 (42)
- 모바일솔루션 (23)
- 모바일콘텐츠 (32)
- 무선충전기술 (13)
- 미디어 방송 신문 (13)
- 미용기기 (15)
- 미중갈등 수혜 (12)
- 바이오시밀러(복제 바이오의약품) (22)
- 바이오인식(생체인식) (18)
- 반도체 CXL (컴퓨터익스프레스링크) (19)
- 반도체 장비 (89)
- 반도체 재료 부품 (56)
- 방위산업 전쟁 테러 (59)
- 백신 진단시약 방역 신종플루 (48)
- 변압기 (11)
- 보안주 정보 (48)
- 보안주(물리) (19)
- 보톡스(보톡스리눔톡신) (12)
- 북한 광물자원개발 (19)
- 브롬 (5)
- 블록체인 (19)
- 비료 (11)
- 비만치료제 (27)
- 비철금속 (27)
- 빈대 (4)
- 사료 (21)
- 사물인터넷 (35)
- 사빅 관련주 (7)
- 산불 (11)
- 삼성페이 (27)
- 생명보험 (5)
- 샤오미전기차 (5)
- 석유화학 (17)
-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7)
- 세종시 (10)
- 셰일가스 (11)
- 소매유통 (21)
- 소모성자재구매대행 (4)
- 손해보험 (7)
- 수산 (10)
- 수소생산 (10)
- 수소차(연료전지/부품/충전소) (70)
- 수소트램 (10)
- 수자원 개선 (29)
- 슈퍼박테리아 (9)
-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 (21)
- 스마트카(SMART CAR) (14)
- 스마트팩토리/스마트공장 (36)
- 스마트폰 (69)
- 스마트홈(홈네트워크) (24)
- 스테이블코인 (21)
- 스팩(SPAC) (66)
- 스페이스X (11)
- 스포츠행사 수혜주(올림픽 월드컵) (12)
- 시멘트/레미콘 (18)
- 시스템반도체 (50)
- 시스템통합(SI) (31)
- 실리콘 음극재 (13)
- 아스팔트 콘크리트(아스콘) (8)
- 아이폰 (21)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32)
- 알래스카 LNG (28)
- 알루미늄 (12)
- 애플카 (15)
- 애플페이 (10)
- 액화석유가스 LPG (9)
- 야놀자 상장테마 (8)
- 양자암호 (14)
- 업비트 관련주 (8)
- 엔젤산업 (25)
- 엔터테인먼트 (28)
- 엠폭스 (원숭이두창) (19)
- 여름 (27)
- 여행 (9)
- 영상콘텐츠 (36)
- 영화 (12)
- 온실가스(탄소배출권)/탄소포집 (19)
- 요소수 (5)
- 우주항공산업(누리호/인공위성) (25)
- 우크라이나 재건 (35)
- 원격진료(비대면진료) (22)
- 원자력발전 (48)
- 월드컵 관련주 (15)
- 웹툰 (12)
- 유리기판 (21)
- 유심(USIM) (5)
- 유전자 치료제/분석 (39)
- 육계 (10)
- 윤활유 (7)
- 은행 (10)
- 음성인식 (14)
- 음식료업종 (62)
- 음원 음반 (14)
- 의료AI (32)
- 의료기기 (82)
-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11)
- 인터넷은행 (31)
- 일 수출규제 국산화 (18)
- 일본제품 불매운동 (20)
- 자동차부품 (111)
- 자원개발 (14)
- 자율주행차 (51)
- 자전거 (7)
- 재난 안전 지진 (21)
- 재택근무 스마트워크 (15)
- 저가항공 (9)
-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6)
- 전구체 (11)
- 전기자전거 (6)
- 전기차 (89)
- 전기차(충전소/충전기) (25)
- 전기차화재방지(배터리열폭주) (29)
- 전력설비 (29)
- 전력저장장치(ESS) (41)
- 전선 (7)
- 전자파 (12)
- 전자화폐/전자결제 (14)
- 정수기 (6)
- 정유관련주 (3)
- 정치-김동연 (11)
- 정치-김문수 (27)
- 정치-안철수 (16)
- 정치-오세훈 (7)
- 정치-우원식 (10)
- 정치-원희룡 (6)
- 정치-유승민 (11)
- 정치-윤석렬 (9)
- 정치-이낙연 (32)
- 정치-이재명 (5)
- 정치-이준석 (5)
- 정치-정원오 (11)
- 정치-조국 (12)
- 정치-트럼프 (13)
- 정치-한덕수 (17)
- 정치-한동훈 (74)
- 정치-해리스 (12)
- 정치-홍준표 (26)
- 제4이동통신 (5)
- 제대혈 (5)
- 제습기 (9)
- 제약업체 (72)
- 제지 (18)
- 조림사업 (11)
- 조선 (6)
- 조선 LNG선 (21)
- 조선기자재 (30)
- 종합물류 (17)
- 종합상사 (8)
- 주류 주정 에탄올 (13)
- 줄기세포 (15)
- 중국기업 (국내상장) (10)
- 중국소비관련 (13)
- 증강현실(AR) (21)
- 증권 (21)
- 지능형로봇-인공지능 AI (59)
- 지역화폐 (5)
- 지주사 (99)
- 창투사 (22)
- 천일염 (6)
- 철강 주요종목 (11)
- 철강중소형 (38)
- 철도 (43)
- 초전도체 (29)
- 출산장려정책 (20)
- 취업 관련주 (8)
- 치매 (47)
- 치아 임플란트 (13)
- 카메라모듈 부품 (30)
- 카지노 (6)
- 카카오 (4)
- 카카오뱅크 관련주 (11)
- 캐릭터상품 (7)
- 캔서문샷 (4)
- 코로나 19 혈장치료 (6)
- 코로나 모더나 (7)
- 코로나 스푸트니크 (8)
- 코로나 음암병실 (8)
- 코로나 진단키트 (46)
-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36)
- 코로나19(음압병실/음압구급차) (7)
-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10)
- 콜드체인(저온유통) (15)
- 쿠팡 테마 (29)
- 클라우드 컴퓨팅 (31)
- 키오스크 (8)
- 타이어 (11)
- 탄소나노튜브(CNT) (6)
- 탈 플라스틱(친환경/생분해성) (8)
- 탈모치료 (21)
- 태양광에너지 (51)
- 태풍/장마 (11)
- 터치패널(스마트폰/태블릿PC) (9)
- 테마파크 (7)
- 테슬라 (14)
- 토스(toss) (8)
- 통신 (3)
- 통신장비 (42)
- 틱톡샵 (11)
- 패션 (52)
- 페라이트 (17)
- 페인트 (8)
- 펩타이드 (7)
- 편의점 (5)
- 폐기물처리 (8)
- 폐배터리 (25)
- 폐암 (7)
- 폴더블폰 (24)
- 품절주 (15)
- 풍력에너지 (38)
- 퓨리오사AI (9)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24)
- 피팅(관이음쇠)/밸브 (9)
- 핀테크 (34)
- 항공기부품 (13)
- 해운 (11)
- 해저터널(지하도로 지하화) (9)
- 핵융합에너지 (8)
- 홈쇼핑 (5)
- 화이자(PFIZER) (7)
- 화장품 (92)
- 화폐 /금융자동화기기(디지털화폐) (10)
- 화학섬유 (7)
- 황사 미세먼지 (27)
- 후쿠시마 오염수 (11)
- 휴대폰부품 (44)
- 희귀금속(희토류) (14)
- 2.상호 관련 종목 분류
- 2022 상반기 상장 (48)
- 2022 하반기 상장 (46)
- 2023 상반기 상장 (49)
- 2023 하반기 상장 (58)
- 2024 상반기 신규상장 (29)
- 2024 하반기 상장 (75)
- APS그룹/코닉오토메이션/디이엔티 등 (5)
- CMG제약 차백신연구소/차바이오텍 (3)
- CS홀딩 /조선선재 (2)
- DMS/비올 (2)
- DRB동일 동일고무벨트 (2)
- HD현대 그룹/ 정몽준, 정기준 (9)
- HLB 그룹 (11)
- JSI그룹/위지트,파워넷 등(6개) (6)
- JW제약관련/디알텍/JW중외제약등 (5)
- KBI그룹 KBI동국실업, 등(3사) (3)
-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2)
- KG모빌리언스/KG그룹 등 (6)
- KH건설/장원테크/KH전자 (5)
- KNN /넥센/성우하이텍/넥센타이어 (4)
- KPX그룹 (6)
- KTis /KT&G/KT/케이티알파등 (6)
- LS그룹/ LS관련 기업, 가온전선 (10)
- SBI핀테크솔루션/SBI인베스트먼트 (2)
- SBS/태영건설/티와이홀딩 (4)
- SFA반도체/에스에프에이 (2)
- SG&G/SG글로벌/SG세계물산 (3)
- SGA/SGA솔루션 (2)
- SGC이테크건설/유니드/SGC에너지 (3)
- SJM홀딩스 SJM (2)
- SNT그룹(SNT홀딩스 스맥 등) (5)
- STX/STX중공업/STX엔진 (3)
- 경동도시가스/경동인베스트/경동나비엔 (3)
- 고려산업/금강공업/케이에스피 (3)
- 골프존/골프존뉴딘홀딩스 (2)
- 광동제약/바이넥스 (2)
- 나노엔텍/SK스퀘어 (2)
- 남화토건/남화산업 (2)
- 네오위즈홀딩스/네오위즈 (2)
- 네패스아크 /네패스 (2)
- 노루(홀딩스/페인트) (2)
- 녹십자그룹/유비케어/뷰노등 (6)
- 농심홀딩스/농심/율촌화학 (3)
- 다산(솔루에타/네트웍스) (2)
- 다우기술/키다리스튜디오/한국정보인증등 (6)
- 대동금속/ 대동기어/대동 (3)
- 대봉엘에스/피앤케이피부임상 (2)
- 대성창투 대성홀딩스 (2)
- 대웅/ 한올바이오파마/대웅제약 (3)
- 대유/조광ILI/엔디포스 (3)
- 대한항공/한진칼/진에어 (3)
- 덕산하이메탈/덕산네오룩스 (2)
- 동국알앤에스/동국제강/동국산업 등 (4)
- 동방선기/일승/세진중공업 (3)
- 동아에스티/동아쏘시오홀딩스 (2)
- 동아엘텍/선익시시템 (2)
- 동일철강 화인베스틸 (2)
- 두산그룹/두산, 두산에너빌리티 /7개 (7)
- 디엔에이링크/오르비텍 (2)
- 디케이티/비에이치/테크엘 (3)
- 디티씨/루멘스 (2)
- 디티앤씨알오/디태앤씨 (2)
- 레몬/톱텍 (2)
- 레이언스/바텍 (2)
- 마니커에프앤지/이지바이오/정다운 등 (8)
- 메가스터디/메가엠디/아이비김영 (4)
- 메타케어/메타랩스 (1)
- 모베이스/모베이스전자 (2)
- 무림SP/무림페이퍼/무림P&P (3)
- 문배철강/ NI스틸 (2)
- 미원그룹/동남합성 등 (6)
- 미코바이오메드/코미코/미코 (3)
- 미투온/고스트스튜디오 (0)
- 바이오 종목 중 흑자 (27)
- 바이오스마트/티씨머티리얼즈 (2)
- 베노홀딩스/다믈얼티미디어 (2)
- 비엘팜텍/모아라이프플러스 (2)
- 사조 그룹관련주 (5)
- 삼기/삼기이브이 (2)
- 삼양그룹(삼양사 등5개) (5)
- 삼화(전자/전기/ 콘덴서) (3)
- 삼화왕관/금비 (2)
- 상신전자/미래나노텍 (2)
- 상지카일룸/중앙디앤엠 (2)
- 새로닉스/엘앤에프 (2)
- 샘표식품 샘표 (2)
- 서연탑메탈/서연/서연이화 (3)
- 서울바이오시스/서울반도체 (2)
- 서울전자통신/지니틱스 (2)
- 서원/대창 (2)
- 서진오토모티브/에코플라스틱 (2)
- 성신양회/성신양회우 (2)
- 세방전지/세방 (2)
- 세아특수강/세아제강/세아베스틸지주등 (5)
- 셀트리온그룹 (3)
- 솔본(인피니트헬스케어, 키네마스터) (3)
- 솔브레인홀딩스/솔브레인 (2)
- 슈퍼개미 관여주 (0)
- 스튜디오산타클로스/넥스턴바이오/이브이 (0)
- 시너지이노베이션/디에스케이/엠아이텍 (3)
- 심텍홀딩스 심텍 (2)
- 쌍방울 관련주 (7)
- 아사아나항공/에어부산/아시아나IDT (3)
- 아이디피/빅솔론/토비스 등 (5)
- 아이스크림에듀 /시공테크 (2)
- 아이윈/아이윈플러스 (2)
- 아이즈비전/파워넷/위지트/머큐리등 (6)
- 아이티센그룹 4사 (4)
- 안트로젠/이엠텍 (2)
- 알톤스포츠/이녹스첨단소재/이녹스 (3)
- 알티캐스트/휴맥스/휴맥스홀딩스 (3)
- 앤씨앤/넥스트칩 (2)
- 에스에스알/지란지교시큐리티 (2)
- 에스엠/SM/키이스트/디어유등 (6)
- 에이텍티앤/에이텍 (2)
- 에이프로젠 관련주 (3)
- 에코프로에이치엔/에코프로/비엠 (3)
- 엑스게이트 가비아 (2)
- 엔피/컴투스홀딩스/위지윅스튜디오등 (5)
- 엘컴텍/파트론 (2)
- 엠케이전자 한국토지신탁 (0)
- 엠투엔 신라젠 (2)
- 영풍/코리아써키트/시그네틱스 등 4개 (4)
- 예림당/티웨이항공/티웨이홀딩스 (3)
- 예스24/한세예스24홀딩스 (2)
- 오리엔트정공/오리엔트바이오 (2)
- 오성첨단소재/화일약품 (2)
- 오션비홀딩스/엠케이전자, 한국토지신탁 (4)
- 오픈베이스/데이타솔루션 (2)
- 와이솔/대덕/대덕전자 (3)
- 우리산업홀딩/우리산업 (2)
- 웅진/웅진씽크빅 (2)
- 원익그룹/케어랩스/원익큐브 등 (8)
- 위니아/대유에이피/대유 러스등 (5)
- 위메이드(위믹스 코인) (3)
- 윈텍/이오테크닉스 (2)
- 윈팩/어보브반도체 (2)
- 유니온커뮤니티/유니온머티리얼 (3)
- 유비쿼스/유비쿼스홀딩스 (2)
- 유진그룹/유진기업/YTN/동양 등 (4)
- 이수앱지스/이수화학/이수페타시스등 (4)
-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3)
- 인바이오젠 /대호에이엘/ 버킷/비덴트 (4)
- 인선이엔티/아이에스동서 (2)
- 인지디스플/인지컨트롤스/싸이맥스 (3)
- 인콘 케이바이오 (2)
- 일진그룹 (5)
- 제일파마홀딩스/제일약품 (2)
- 제주항공/애경산업/AK홀딩스 (3)
- 젠큐릭스/엔젠바이오 (2)
- 젬백스링크/플래스크/삼성제약등 (4)
- 조비 경농 (2)
- 조선내화 CR홀딩스 (2)
- 종근당/경보제약/종근당바이오등 (4)
- 주가조작 관련되었던 회사들 모음 (15)
- 중앙첨단소재/광무/엔켐 등(5개) (5)
- 진양화학 진양폴리 진양제약 진양산업 (5)
- 초록뱀 관련사 /인포마크 (5)
- 카카오 (4)
- 케이이엠텍/대진첨단소재 (2)
- 케이피티유/알루코 (2)
- 코스나인/아이큐어 (2)
- 코스맥스비티아/코스맥스엔비티 (3)
- 코윈테크/탑머티리얼 (2)
- 콜마그룹/한국콜마, 콜마홀딩스 등 4 (4)
- 큐로홍딩/큐캐피탈/지엔코 등 (4)
- 크라운해태홀딩스/크라운제과/해태제과식 (3)
- 탑엔지니어링/파워로직스 (2)
- 태경케미컬/태경비케이/태경산업 (3)
- 태광/에이치와이티씨 (2)
- 평화(홀딩스/산업) (2)
- 포스코그룹/POSCO홀딩스 (6)
- 폴라리스우노/폴라리스세원/우노/셀바스 (6)
- 퓨런티어/하이비젼시스템 (2)
- 프리지션바이오/아이센스 (2)
- 플레이그램/MDS테크 (2)
- 피에스케이홀딩스/피에스케이 (2)
- 피엔씨테크 광명전기 (2)
- 필옵틱스/필에너지 (2)
- 하림그룹(팬오션, 하림등 5개사) (5)
- 하이트진로/하이트진로홀딩스 (2)
- 한국선재/한선엔지니어링 (2)
- 한국앤컴퍼티/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2)
- 한국정밀기계/한국주강 (2)
- 한국컴퓨터/한네트/로지시스/케이씨에스 (5)
- 한국큐빅/삼영무역 (2)
- 한국화장품/한국화장품제조 (2)
- 한독 제넥신 툴젠 (3)
- 한미약품/제이브엠/한미사이언스 (3)
- 한솔그룹/한솔홀딩스(9개사) (10)
- 한일진공/케이피엠테크/텔콘RF제약등 (4)
- 한컴그룹(한글과컴퓨터 등 3사) (3)
- 해성그룹(해성산업 등 5개) (5)
- 헥토이노베이션/헥토파이낸셜 (2)
- 현대바이오랜드/현대퓨쳐넷등 (3)
- 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 등(8개) (11)
- 협진 씨아이테크 (2)
- 형지I&C 형지엘리트 /형지글로 (3)
- 홈센타/보광산업 (2)
- 화승그룹/코퍼레이션/인더스트리/엔터 (4)
- 화천기계/화천기공 (0)
- 효성그룹관련주 /신화/ 갤럭시아등 (8)
- 휴네시온/모비스/에이디엠코리아 (3)
- 휴맥스 /휴맥스홀딩스 /알티캐스트 (3)
- 휴온스글로벌/휴온스/휴메딕스 등 (5)
- 희폐-일동제약,홀딩스 (2)
- 3.기타/ 특이종목들 기록
- M&A/에스엠그룹삼라/에스엠하이플러스 (5)
- SG증권대량매도사태 (8)
- 국민연금공단투자 (17)
- 기술특례 상장 (1)
- 기술특례 후 상장폐지 (1)
- 바이오 종목 중 흑자 (27)
- 사건-CFD (9)
- 세계 국내 1위 최초 (3)
- 슈퍼개미 관여주 (0)
- 조용한 상승주 (1)
- 주가조작 관련되었던 회사들 모음 (15)
- 회사명 자주 바뀌는 종목 (1)
- 희특-시총 777 (0)